-
2020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한국사회의 장례문화: 장례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장례의식: 죽음을 다루는 비즈니스
(스프링어 출판사, 2019)
한길수(호주 모나쉬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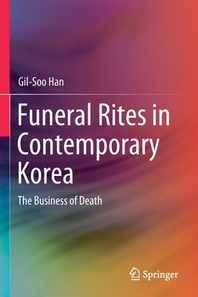
세계화 추세 속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적 전통과 비한국적 (또는 서양적) 전통 간의 조우입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서양화? 한국 전통의 준수? 또는 서양 문화의 흡수? 개인들이야 그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의례들에 대해 적절한 결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 또한, 저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성찰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도 공유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사실 장례는 그 성격상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귀중한 기회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자는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죽음이라는 개념을 성숙한 자세로 마주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야말로, 장례라는 의식 또한 성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례를 비롯한 인간 삶의 모든 측면들이 이익 추구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전문화(professionalisation)에는 언제나 경제적 보상, 경쟁, 이익창출 등이 수반되기 마련이어서, 현재의 생산환경에서 그런 경제적 거래들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추구, 전문화, 그리고 이익창출 간에 모종의 균형을 찾긴 해야 할 것입니다. Outhwaite et al. (1996: 513)는 장례 관련 직종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의 핵심은, ‘나름의 직업적 윤리강령 및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계 운영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전문직은 현대사회 제도 인프라의 일부이다.”라는 정리가 그것인데, 장례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에 기반하여 장례 절차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장례 전문가들이 그를 중시하고, 그 문제의식을 문상객을 위한 일상 업무에 녹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시신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당연히 화장이 어디서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던 것이지요. 이렇듯 과학적 증거나 공동체적 합의 없이 당연시하는 부분들이 장례라는 사안 외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 언론, 지식인, 사회평론가, 정치인들의 역할을 새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장례 비즈니스와 관련,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노력도 많이 포착되지만, 개선의 속도는 느린 데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유의미한 장례를 치를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는 필요한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70세 이상의 상주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상주가 절을 통해 문상객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통적 방식(한국의 전통 방식인, 바닥에 무릎을 꿇는 맞절)은 사실 무릎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조문객이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리주의에 있어, 일의 중요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효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현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고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무엇보다도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일례로,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 이민자들의 경우 죽음이나 장례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해도 삶의 의미를 입에 올리는 일은 적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의학 교수인 허대석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우리의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면(In Order to Make Our Death a Life)』에서 ‘안락사’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가 질병치료 및 생명유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를 통해 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논쟁적 주제를 담은 이 책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사회적 공개 논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힘입어 죽음과 삶의 질도 향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장례 산업의 특징에 대한 궁금증이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일차적 이유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유례없이 빠른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합니다. 의례의 변화, 자본주의 논리의 개입, 그리고 현대화에 직면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 목표, 가치, 그리고 그들 간에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의 인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도구적인 방법들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선택한 전략과 방법이 적절한지, 또는 윤리적인지의 여부는 일차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윤리성, 명예, 권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함과 편익의 사이에서 갈등해 왔습니다. 올바름을 무시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쾌락주의로 이끌었고, 욕구를 무시하고 올바름만 추구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서구 사회의 공리주의가 아닌, 비합리성에 기반한 공리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혈연, 학벌주의, 지역주의가 공리주의를 압도합니다. 김석수는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공리주의가 비이성적인 공리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천민자본주의와 천민민주주의가 도덕성이라는 외피를 쓴 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132쪽)고 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인데, 장례의 상업화 자체보다는 과도한 상업화가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도, 현재진행형인 근대화, 현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통념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돼 왔으며, 특히 지식인들은 왜 한국이 OECD 회원국이면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이 보이는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워해 왔습니다. 책에서도 언급된 영업상의 부정행위, 비전문적 고객 접근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 내에 많은 문제들이 고쳐지고 문제들의 심각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OECD 국가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추구하는 나라들 역시 그들만의 문제, 그들 나름의 고유한 결점과 한계들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나라, 시민의식을 가진 지역사회조차도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종종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과 의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음을 알더라도 그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곤 합니다.
이는 개인에 비해 구조의 지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합리적,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은 공존하기 마련이며, 그런 문제들은 그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경우) 장례식장이 병원 안에 위치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회는 사실 과도기에 있습니다. 세계화된 세계에는 어디를 가든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은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고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다른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죽은 사람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이 책의 집필을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게 된 것은 한국 대중들의 관심이 (정작 망자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망자 대우에 더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후 자신의 장례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없으므로, 죽기 전, 즉 살아있는 동안 사후의 자신에 대한 처리방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례의식은 한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그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 싶은지를 잘 보여 줍니다. 죽음은 삶의 끝에 겪어야 할 마지막 순간이기보다, 인간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 사회 전반은 물론,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합니다. 비판 받을 관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아마도 그 중 일부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데, 지난 수십 년간 노출된 수많은 문제적 관행들의 와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언제나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했지만, 바로 그것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2019, Springer)
Professor Gil-Soo Han
School of Media, Film and Journalism
Monash University
An ongoing debate in the midst of globalisation is about the meeting of Korean and non-Korean or Western traditions.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Westernisation, sticking to Korean traditions or incorporation of Western culture? Individuals have all the options available but their own ability to be reflective of their desires and making an informed decision about all the rituals in their life along the way might be what is required. Taking a chance to reflect on life and death myself, and sharing this chance with others has been my personal goal to achieve in this book. Indeed, the funeral rite is supposed to offer a valuable time for reflection, but its value is reduced in the current context of Korean society. Death is not far away from any living person and it is always near one’s doorstep. Those individuals and societies that can handle the idea of death in a mature way can perhaps handle funeral rites in a mature manner.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every bit of activity in human life including the funeral rite is so tightly geared towards making a profit. Nonetheless, professionalisation ought to involve financial reward, competition and profit-making in the current economic context and I am not prepared to critique such economic exchanges under the currently prevalent modes of production, but the problem is about finding a balance between human dignity, professionalisation and profit-making. Outhwaite et al. (1996: 513) are clear about the nature of the funeral profession: ‘A central aspect of professions is that they are a means to make a living that is self-regulated through 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Professions are also par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modern societies.’ Undoubtedly, ethical conduct on the basis of these principles is well understood, live and well in the minds of most funeral professionals and in their practices. A mission is to have more of them accept such ethical conduct and to embed it in their everyday service for mourners.
I was also surprised to learn that full-body burial, not cremation, is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of disposing of the dead. I have taken it for granted for years that cremation is the most desirable method everywhere. I have been uncritically influenced by the prevalent and popular ideas from a particular place. There is a chance that there are many other matters that are taken for granted without scientific evidence or a required public decision. This raises the need to rethink the roles of the media, intellectuals, social commentators and politicians in particular as they have a duty to inform the public.
I have also discovered many positive movements around the business of death. However, the slow pace of improvement is obvious and the same type of problems are prevalent and continue to be repeated. Korean society needs to continue to debate the best ways in which funeral rites can be most meaningfully observed with reasonable costs. For example, in the fast-ageing Korean society, the chief mourner could be aged well over 70. The chief mourner’s traditional way of bowing and expressing respect to the visitors (i.e., mutual bowing in a Korean traditional way, kneeling on the floor) could damage his knee-caps. In the past, the acquaintance’s visiting and paying a tribute to the dead in the funeral hall was considered important, but it is not so any more. That is, utilitarianism is not only an important matter, but being considerate of others’ needs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process,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how it could be practised in contemporary society ought to be reconsidered. I have argued that the reason to give serious thought to open discussion about death is that we want to value our life and try living a worthwhile life. I found the Chinese immigrants in Australia are generally open to discussing their own death and funeral, although they simultaneously remain deeply reserved in openly discussing and questing for the meaning of life. It is safe to argue that South Koreans are much the same.
Hurh Dae-Seok, a professor of medicine, touches on the sensitive topic of euthanasia in his empirically based book, In Order to Make our Death a Life. This opens the debate about making informed decisions on the treatment of disease and life support, which will then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This is a good start to the public debate on preparing for death and there needs to be more. I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and life.
A specific question that started this book project was a feature of the funeral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 fundamentally underpinning query was my ongoing quest for the understanding of a Korean society that has gone through rapid and unprecedented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broader question which we ought to think about with reference to ritual, capitalist development and modernisation is: what kind of society should we build or move towards? The ongoing debate about human understanding of duties, goals, values and how we find a balance between them is relevant here.
However, in the contemporary world, humans are preoccupied with strategic and instrumental methods to accomplish their goals. Whether those strategies and chosen methods are pertinent or not is not necessarily a primary and ethical concern. Humans have always been pulled between ethics/pertinence/rightness on the one hand and desirability/convenience on the other. Ignoring ethics and pursuing desirability will lead us to hedonism, ignoring desirability and pursing rightness will lead us to asceticism.
The Korean economic growth has not necessarily been based on western society’s rationality-based utilitarianism, but on irrationality-based utilitarianism. Rather, blood-based networks, academic elitism and regionalism surpass utilitarianism. Kim Seok-Su is precise in pointing out that the prevalent utilitarianism in Korea is no more than irrational utilitarianism: ‘Pariah capitalism (천민자본주의) and pariah democracy (천민민주주의) are dressed in morality and prevalent in the Korean society’ (p.132). The commodification of funeral rites is not a problem, but an excessive commodification is.
The question of modernity in progress is at the heart of what has initiated this book project. The notion that Korean society is in transition has been pronounced for the last few decades. Intellectuals question why the Republic of Korea as an OECD member country has the socio-economic features that may be commensurate with developing countries. Fraudulent business behaviours and unprofessional approaches towards clients discussed in the book are examples. Undoubtedly, many problems will be rectified over the years and the extent of the problems could be redressed. Nonetheless, one should not forget that all the OECD nations or the popular contests for ‘the best place to live’ have their own problems and pose their own unique flaws and challenges. That is, even the most advanced nations and communities with civilian consciousness are full of irrational thoughts and behaviours. Individual agents may often be unaware of an irrational dimension of the activities and rituals they engage in, or may be limited in what they can do about these activities if they find them problematic.
This is in part due to the overwhelming dominance of the structure over the individual agents. Rational and irrational thoughts and behaviours coexist in all societies and are manifest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society’s structural and cultural contexts. The location of funeral halls in hospitals is an example. In this respect, every society is in transition. In the globalised world, there are certain features in common wherever we go and the problems and concerns in those societies could be redressed, applying similar and common remedies. Also, there are problems that are place-specific and they might require more specific remedies.
Finally, this book project started with my interest about the treatment of the dead, but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Korean public focus is not necessarily on the dead, but what live people do to the dead. The dead have no control over what is done to them. What is to be done over their dead body has to be requested while they are alive. Thus, funeral rites make a significant reflection of what a society is like and where it is going, that is, what kind of society the Korean people would like to build themselves. Thus, death is part of human life, not the last bit that one has to go through at the end of their own life. Moreover, this book has provided thorough critical reflection on Korean society in general and Korean funeral rites in particular. There are lots of practices that deserve critiques and reflection, but I have to point out I am convinced that many problematic funeral practices will partly remain, being only partly addressed. Overall, Korean society will move in positive directions and this is what it has displayed with many other problematic practices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pace has been overly slow, but that is how the society moves forward.
-
글쓴날 : [21-09-28 11:43]